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더,오래] 말 없이 화장대에 붙여둔 아내의 포스트잇
<중앙일보> 2018.01.29
부부만 남은 집엔 말이 사라져
『섬에 있는 서점』같이 읽기 시작
맘에 드는 구절에 아내는 모퉁이 접이
상대의 생각, 취향 읽는 재미 쏠쏠
일주일에 두어 번 외출하는 일이 없을 때면 종일 가야 “점심엔 뭐 먹지?”라거나 “커피 하겠수” 정도의 대화만 오갈 따름이다. 어쩌면 결혼하고부터 부모님을 모셨던 관계로 부부만이 생활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부부만 남아 ‘사건’이 없는 생활을 견뎌야 할 시간은 길게 남았으니 뭔가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었다. 출구는 뜻밖의 것에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았다.

책 '섬에 있는 서점', 개브리얼 제빈 지음.
우연히 『섬에 있는 서점』(개브리얼제빈 지음, 루페)이란 책을 만났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앨리스 섬에 있는 작은 서점주와 출판사 영업사원의 사랑을 축으로 하는 소설이다.
주인공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고, 절절한 로맨스도 아니다. 그렇지만 평범하지만 착한 등장인물들이 엮어내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다.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아내에게 권하자 틈나는 대로 책을 펴들었다. 그러다 보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은 책을 읽는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이게 제법 의미가 있었다.
난 밑줄, 아낸 모퉁이 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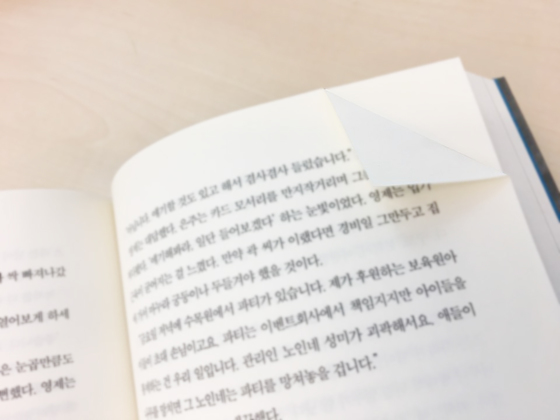
도그즈이어(dog's ear).
“난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비뚤어졌죠.” “사람이 늙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거야.” 내가 밑줄 친 이런 구절에서 아내는 나의 은근한 사과나 인터넷 뱅킹도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을 엿봤을까.
“인간은 홀로 된 섬이 아니다. 아니 적어도, 인간은 홀로 된 섬으로 있는 게 최상은 아니다.” “목적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방황하는 자에게도 방황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법.” 이건 아내의 도그즈 이어가 품은 구절을 찾아낸 건데 무슨 심사로 여기에 꽂혔을까 잠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화장대 옆 의문의 포스트 잇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마음도 닦아야 한다. 기도의 목적은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거 어느 스님의 말씀이라는데 나를 겨눈 화살은 아니겠지?
김성희 북 칼럼니스트 jaejae99@hanmail.net
'세상보기--------- > 현대사회 흐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동주, 길 잃은 세계인에게 삶의 방향" (0) | 2018.04.26 |
|---|---|
| 작가들의 말 말 말 (0) | 2018.02.08 |
| 진보라는 말이 사라진다 (0) | 2017.12.15 |
| 백범 김구는 왜 광복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0) | 2017.12.06 |
| 나 혼자 산다 (0) | 2017.10.20 |




